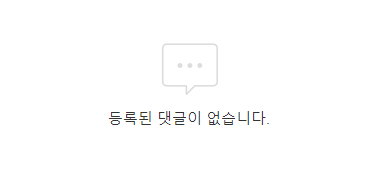영화 미학과 역사를 강의한 지 금년으로 10년이 된다. 그리고 비로소 눈치채게 되었다. 영화미학의 꽃은 리얼리즘, 엑스프레셔널리즘 뭐뭐하는 관념적인 ‘이즘’이 아니라 스크린 위에 거대한 이미지로 점멸하는 배우와 그들의 600개 근육으로 표현되는 탱탱 살아있는 육체의 향연, 바로 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객이 보는 것은 작가의 철학이나 영상미가 아니라 배우의 몸과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삼 배우들을 다시 보고 있다. 그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토해내는 꿈과 좌절, 사랑과 증오의 연기를 다시 보고 있다.
박중훈의 영화연보에는 보통 그가 1986년 무명시절에 출연한 <바이오 맨>이라는 색다른 영화가 빠져 있다. 왜 있지 않은가? 방학이 되면 심심한 아이들을 위해 적은 제작비로 급조되는 한국형 B급 유사 SF 영화들. 박중훈의 19년 영화연보는 충무로 저 밑바닥부터 최고의 스타까지, 제목을 거론하는 것이 뭐한 저급한 영화부터 우리 시대 한국영화 대표작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극심하다. 또 청춘멜로, 코미디, 액션,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영화를 통해 끝없는 변신의 모습을 보여 온 한 배우의 투쟁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박중훈은 그대로 1990년대 한국영화의 역사다.
그는 나이 스물에 <깜보>로 데뷔해 <바이오 맨>과 <내사랑 동키호테>를 거치며 방황하다가 스물다섯부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고 <우묵배미의 사랑>같은 90년대 초반 한국영화의 대표작과 함께 ‘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투캅스>와 <게임의 법칙>과 같은 그 시기의 대박영화와 함께 톱스타가 되었다. 그때 나는 ‘충무로 영화는 박중훈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구분된다’는 20자 평을 날려 자기가 톱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른 한국배우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박중훈을 위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도 우선 그에게 전달되던 시절, 충무로는 그를 박중훈이 아니라 ‘박 스타’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러러 숭배했다.
톱스타는 밤하늘에 높이 떠 빛나기 때문에 화려하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까 두렵다. 자기도취와 고소공포증은 인간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는 많은 졸작 영화들을 찍었고 그 방탕의 절정은 1997년이었다. 5편을 찍었다. 그리고 그해 말 술 취했던 한국경제가 파산했다. 90년대 한국영화의 자화상이었던 ‘박 스타’의 인기가 그때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